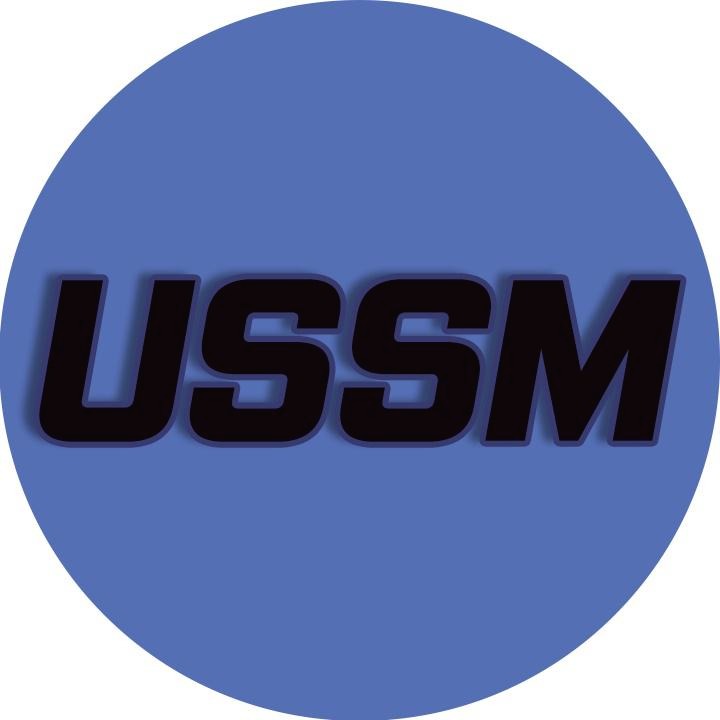우리도 씁니다
언론의 편향과 ■■ 본문
Quiz
{언론의 편향과 ■■}
0.1
편파(偏頗), 편중(偏重), 편중(偏重)
뉴스의 가치를 논할 때 악 (惡) 취급받는 것들이다.이것들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영악하고 오만한 의도라는 이유로 쫓겨난다. 그래서 나는 치우침(편향)에 주의한다. 반면, 나는 ■■을 신성시한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계단에 있는 난간이랄까, 사실로 가는 해결책처럼 믿는다. ■■은 편향의 반대말이니까.
0.2
그런데 문제가 있다.
채널을 손에 꼽을 정도였을 때는 옳고 그른 것이 아름다울 정도로 명확해 보였는데, 지금은 각자 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언론들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사실’을 다루는 각자의 솜씨로 각자의 색깔을 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인 언론을 고를지, 누구의 손을 잡고 갈지 신경이 곤두선다. 누가 치우쳤지? 누가 ■■이지?
0.3
나는 푸짐한 채널 앞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타협안을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걸까? 여전히 ■■은 언론의 성역일까? 치우친 보도는 어쩔 수 없는 걸까? 그렇다고 아마추어의 오류, 명백한 악의를 품은 보도, 허기진 추측으로 채운 상상. 이런 것들에 정식 취재와 보도라는 지위를 부여해서 끌어안고 싶지는 않은데.
0.4
다시 고민한다. ■■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낸다.
정보만 툭 던져주는 언론을 찾아볼까. 아니면 ■■을 위해 소파에 붙어살면서 모든 채널을 빠짐없이 볼까? 그다음, 극과 극을 더하고 N 분의 1로 나눠서 나만의 답을 얻어볼까? 하지만 여전히 찝찝하다. 내비게이션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낭떠러지가 4km 앞이라고, 다른 하나는 10km 앞이라고 말한다면 수치를 더하고 나누는 짓은 7km 앞이 낭떠러지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건 쓸모없고 멍청한 결론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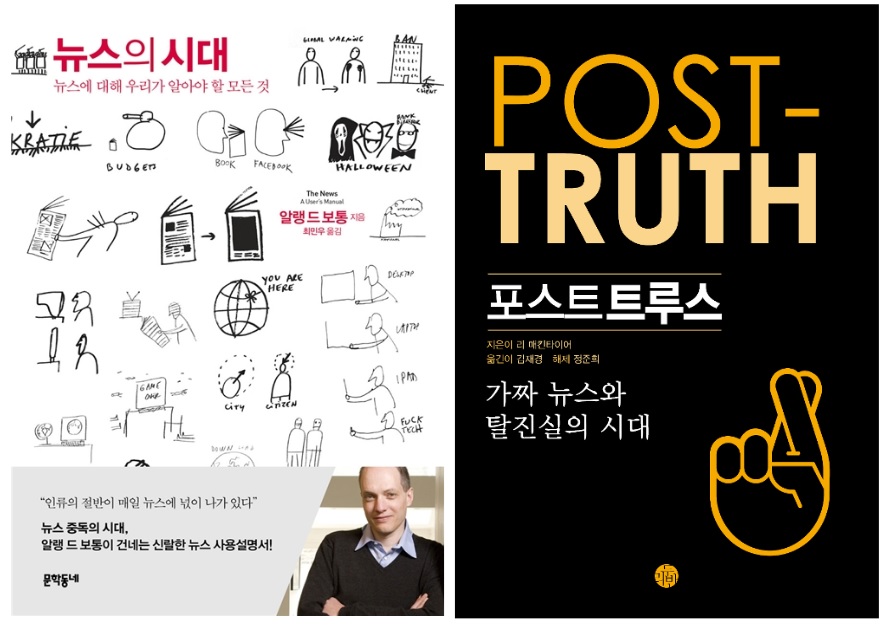
1. 알랭 드 보통, 『뉴스의 시대』, 문학동네, 최민우 역, 2014 .
2.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 트루스』, 두리반, 정준희 해제, 김재경 역, 2019 .
「뉴스의 시대」
1.1
저널리즘에서 편향은 악명이 높지만
어쩌면 그것에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고, 보통 선생이 말한다. 그는 편향을 관대한 시각으로 본다. 그에게 편향은 자신의 시각으로 사건을 평가하는 방법일 뿐이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의 편향으로, 제인 오스틴은 제인 오스틴식의 편향으로, 공자는 공자답게 사건을 해석하듯이. 아니, 까놓고 말해서 이런 식이라면 편향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식이라면 편향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은 ‘지나치고 무모’해보인다.
그는 뉴스의 한계를 인정한다.
뉴스는 어차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초상화가’가 아니라는 것. 뉴스는 자본에 얽혀있고 말과 이미지와 이야기의 구조를 선택하면서 이야기의 극히 일부만 뽑아내니까. 이것이 뉴스의 태생적인 구조니까.
“뉴스는 어떤 이야기를 조명하고
어떤 이야기를 빼버릴지 선택하면서
단지 현실을 선택적으로 빚어낼 뿐이다.”
「뉴스의 시대」 51쪽 중
그의 말이 맞는다면,
내 앞에 있는 언론도 항상 고민에 빠지고 선택할 것이다.
어두움과 잔인함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용기와 긍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난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원자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는? 경제지표는? 기업 총수는? 야당은? 여당은? 미덕을 조명할 것인가, 결점을 조명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1.2
그의 말이 맞는다면,
‘현실 그 자체’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짓은 무의미하다. 세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스스로 젠체하는 언론일지라도 자신의 편향과 보도의 한계를 박살 낼 수 없으니까.
그의 말대로,
오히려 편향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을 거두고 편향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선생은 편향을 ‘한 쌍의 렌즈’에 비유한다. 왜? 언론이 고유의 편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사건을 비출 때 언론은 우리에게 사건의 의미와 함께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편향된 시각이 생산한 ‘더 믿을 만하고 유익한 뉴스’에 올라타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좋은 편향’이 ‘편향이 없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뉴스를 조율하고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포스트 트루스」
2.1
객관, 공정, 균형, ■■.
미국 전통 언론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전통 언론의 보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었다. 그들은 전통 언론이 편향되었다며 의심했고 비난했다. 언론이 정치인 놈들한테 붙어먹었다고.
그럼에도 전통 언론은 강했고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꾸준히 구독됐다. 전통 언론과 경쟁할 만한 상대는 없었다. 딱 1980년대 후반까지. 시간이 흘러서 다양한 언론 채널이 머리를 내밀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소셜미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보고 싶지 않은 언론은 회피하고 보고 싶은 언론을 골라보면 그만.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골라 먹는 재미로 뉴스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전통 언론을 벗어나 자신이 듣고 싶은 쪽으로 이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LA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ABC, CBS, NBC. 그들의 황금기가 기울었다.
2.2
1996년, 편향적인 케이블 뉴스쇼가 인기를 얻자
전통적인 뉴스룸은 당황했다. 그렇다고 케이블 뉴스쇼처럼 바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런 것들’ 과 동급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전통 언론은 시청자를 뺏기지 않으면서도 우아함과 품격을 지키고 싶었다. 결국, 전통 언론은 오히려 케이블 뉴스쇼와 완전히 반대로 가기로 결심했다. 싸구려는 들어가,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보여 줄거야,라는 식으로. 그들이 저널리즘 과목에서 배운 ‘객관성’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차별화 한 것이다.
“이제부터 정말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어떤 논점을 다루더라도
양쪽 입장을 모두 보도하기 시작했다.”
「포스트 트루스 」109쪽 중
2.3
전통 언론은 모든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다.
사안의 반대자를 섭외하고 양쪽으로 분할된 TV 화면에 모두를 비췄다. 모든 입장에 ‘균등한 시간’을 줬다. ‘기계적인 ■■성’을 추구한 것이다. 결과는? 의견이 갈리는 주제에서는 바람직했다.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보도에서는 최악의 방법이었다
2.4
어처구니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정확한 뉴스 보도가 힘들어졌다. 이 모든 것이 거짓에게 마이크의 기회를 준 탓이었다. 거짓은 ■■에 집착하는 미디어 앞에서 머리를 내밀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왔다. 그들은 증거가 수두룩한 사실을 논란거리로 만들었고, 기존의 것을 의심하고 도전하겠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거짓을 변호할 때 방패처럼 요긴하게 쓰였다. 사소한 흠을 찾아낸 악의적인 목소리가 대중의 귀로 들어갔다. 대중은 합의가 이미 끝난 사실을 의심했고 각자의 친구에게 ‘뉴스에서 봤다’며 의혹을 전달했다. 그렇게 진실을 향한 ‘반대 담론’이 퍼지고 커졌다. ‘뚜렷하던 것’이 흐려진 것이다.
리 매킨 타이어의 지적은 ■■이 역설적으로 혼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객관? 공정? 균형? ■■? 그는 이 단어들을 절대시 하는 사람을 아니꼽게 본다. 이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전통 언론은 도구에 집착한 나머지 도구가 목적이되었고 정작 진실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렇게 진실은 갑자기 보호자 없이 남겨졌고, 난도질 당하기 좋게 끌어내려지고, 똥을 맞았다.

답 :
by. 얼치기
'얼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 겨울 거리 (6) | 2020.12.21 |
|---|---|
| {퀴즈}무모한 ■■ (0) | 2020.12.02 |
| {퀴즈} 계급과 ■■ (0) | 2020.11.25 |
| {퀴즈} 서울, 그리고 ■■ [11월: 서울에 대하여] (0) | 2020.11.11 |
| 어쩌다 씁니다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