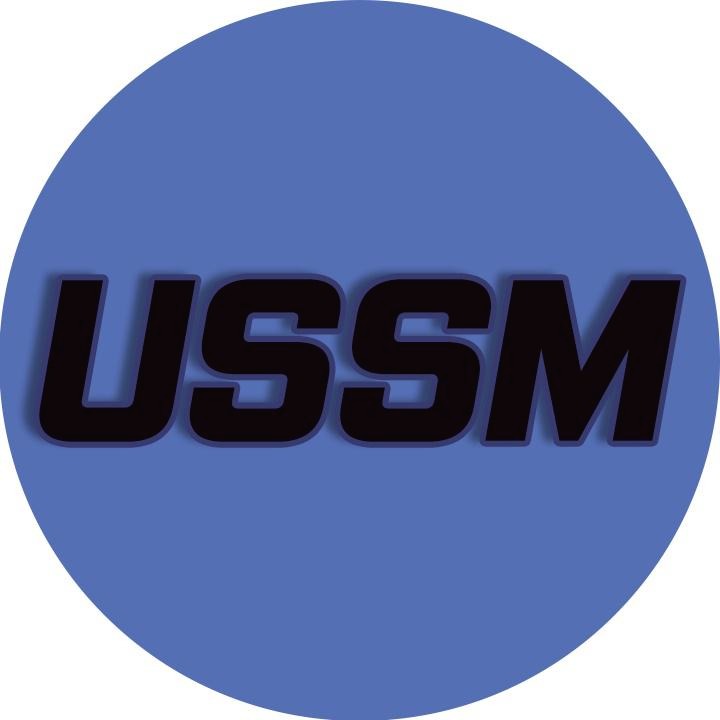우리도 씁니다
무수히 많은 밤이 뛰어올라 본문
취업이 걱정되는 게 아니겠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할까봐, 사무직으로 일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그도 그럴 게 제조업과 현장직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니까. 시장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수요와 공급이 우연히 만나 결정된 노동의 가격을 존중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우연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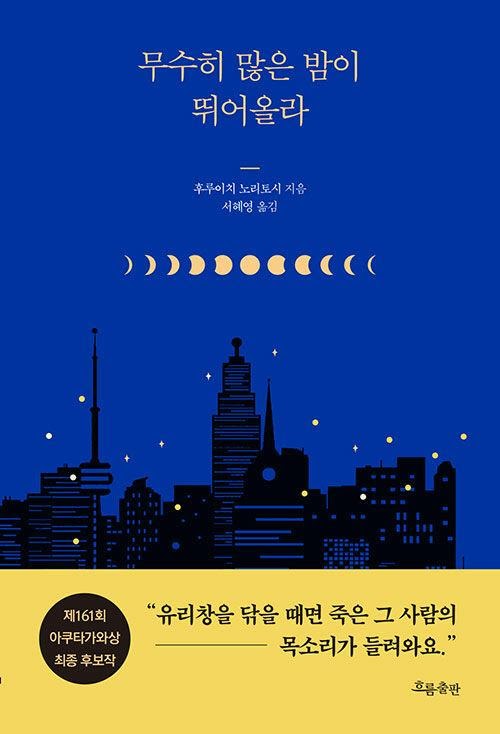
유리 한 장으로 갈리는

아래에서 고층 빌딩 안을 쳐다보면 유리가 빛을 반사할 뿐이다. 유리에는 다른 빌딩의 모습이 반사될 뿐 빌딩 안은 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철로 된 것처럼 보이던 유리도 결국은 유리다. 가까이에서 들여다 보면 그 안이 보인다.
<무수히 많은 밤이 뛰어올라>에서 주인공 쇼코는 괜찮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다. 또 면접을 실망스럽게 본 쇼코는 횡단보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 건물 외벽에 붙어 창문을 닦는 사람을 발견한다. 무심코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창문을 닦는 기업에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었다. 수입은 불편할 것 하나 없었다. 월급 18만 엔으로는 대학생 때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쇼코는 잘나가는 친구들의 소식을 보는 것이 씁쓸해서 SNS를 그만뒀다. 생활에 불편함 없는 보수지만 쇼코는 부끄럽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걱정하며 집밖으로 나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쇼코는 창문을 닦을 때마다 보이는 창 안 세상과 창 밖 세상의 괴리감을 느낀다. 그러다 한 집에 립스틱으로 3706이라고 써진 방을 지나쳐 내려간다. 그 방은 어두운 커튼으로 창을 가려두었다. 밖에서 똑바로 보이게 3706이라고 썼다면 안에서는 거꾸로 써야 했을 거다. 그만큼 이 방의 주인은 누군가 이 숫자를 봐주기를 바랐다. 쇼코는 일을 끝내고 그 빌딩으로 가서 3706호를 호출한다.
3706호에는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노부인은 쇼코에게 일을 하면서 빌딩 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쇼코는 받아들인다. 노부인은 그 보상으로 창문닦이 연봉과 비슷한 금액을 지불한다. 이 이상한 노동을 시작하고 쇼코는 즐거워한다. 돈이 아니라도 노부인을 찾아가는 것이 순수하게 즐겁다.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쇼코와 안에서 바깥을 관음하려고 하지 않는 노부인의 묘한 관계가 소설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 나간다.
적은 수입은 부끄러운가?
쇼코는 친구들에게 나서기 부끄럽다. 적은 수입도 부끄럽고 현장직도 부끄럽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루저로 취급한다. 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고위 공직자 중에 고졸은 매우 적다. 20대 한국 국회에서 4명이던 고졸 이하 국회의원 수가 21대 국회에서는 1명으로 줄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인 판사나 검사는 고졸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문학을 통한 해결
작가인 후루이치는 사회학 에세이로 유명하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통해 치솟는 불평등과 비정규직 비율에도 왜 젊은이들이 행복해하는지 고찰한다. 겨우 대학 학부생 시절에 쓴 책은 ‘사토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을만큼 일본 내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본을 연구하고 행복을 고찰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었다.
그랬던 후루이치가 문학을 쓰고 일본의 유명한 문학작품상인 아쿠타가와상의 후보로 올랐다. 흥미로운삶 아닌가? 교수도 아닌 일개 학부생이 사회학 저서를 써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이제는 돌연 문학이라니.
후루이치는 <무수히 많은 밤이 뛰어올라>에서 문학적 해결을 시도한다. 사실 사회학은 해결책을 잘 내지못한다. 사회학은 과학적 방법론인 통계를 끌고 와서 일견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인문사회 영역은 거의 모든 현상이 예측불가능하다. 동양과 서양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쇄술이 등장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서양에서는 인쇄술을 토대로 이성과 과학이 발전했지만 동양에서는 문자가 여전히 지배층의 전유물로 남아있었다.
어떤 변화를 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해결은 당연히 어렵다. 그래서였을까. 후루이치는 사회문제를 낭만적 기술記述로 해결하려고 한다. 소설 속 쇼코는 비록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를 기록하고 사회에 참여한다. 후루이치는 쇼코를 통해 중상층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개인의 삶을 밝히려 하고 있다.
by. 김도겸
김도겸
인스타 : @dogyeom._.kim
브런치 : https://brunch.co.kr/@ehrua0208
우리도 씁니다.
인스타 @ussm._.nida
블로그 https://blog.naver.com/ussm2020
티스토리 https://wewritetoo.tistory.com